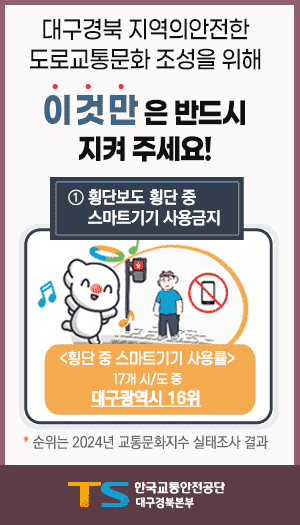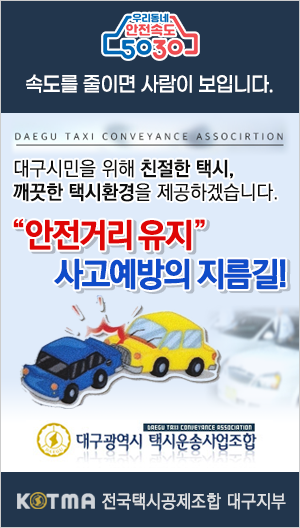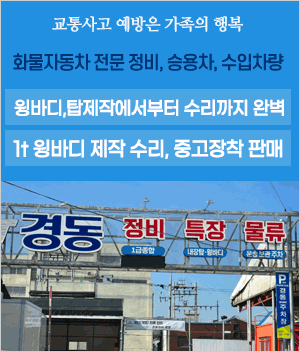김포 정치권과 지자체는 GTX-D 서울역 직결안 통과에 환호했지만, 시민이 기대한 ‘강남 직결’은 빠진 채 확정됐다. 강남 수요와 도시 성장 전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산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타는 김포시민. ⓒ교통일보김포시민이 기대한 건 ‘강남 30분 시대’였다. 정치인들은 수년간 이를 내세워 지역 여론을 달궜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D 선행구간)이 강남까지 직결될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당산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타는 김포시민. ⓒ교통일보김포시민이 기대한 건 ‘강남 30분 시대’였다. 정치인들은 수년간 이를 내세워 지역 여론을 달궜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D 선행구간)이 강남까지 직결될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7월 1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D노선은 강남이 아닌, 김포 장기에서 검단·계양·부천을 거쳐 B선로를 공용해 용산·서울역 방면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은 마치 공약이 실현된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강남 직결 필요성, 단순 선호가 아니다
강남 직결이 현실에서 멀어진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D노선 강남 직결안을 제외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성 부족과 기존 노선과의 중복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김포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는 “직결 추진 중”이라며 여론을 결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안이 철도망 계획에 재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예타 확정안에서도 서울역까지만 연결되면서 사실상 ‘강남 직결’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강남 직결의 필요성을 단순한 ‘노선 선호’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고, 시의 장기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7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KOSIS 자료 기준 김포 취업자의 약 3~4명 중 1명이 서울로 통근하며, 서울 내 고용 밀집 상위권인 강남권으로의 접근 수요가 크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는 대기업 본사, 글로벌 IT기업, 금융기관이 집중된 고밀 업무 축을 형성하고 있어, 단순한 ‘서울 진입’보다 ‘강남 직결’이 통근 효율성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역이 위치한 도심권은 법률·행정·금융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직장 밀집도나 기업 본사 수에서 강남권과는 산업 구성과 분포가 다르다.
김포에 필요한 것은 ‘실제 교통망’이다
 ‘준비된 김포’라는 역내 광고문구와 달리, 매일 출퇴근길 붐비는 김포골드라인 승강장. ⓒ교통일보
‘준비된 김포’라는 역내 광고문구와 달리, 매일 출퇴근길 붐비는 김포골드라인 승강장. ⓒ교통일보
김포 시민이 강남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김포골드라인과 9호선 등 이미 혼잡한 노선을 거쳐야 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200%를 넘는 혼잡률과 최소 1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물리적·심리적 장벽은 강남 직결 노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정부는 D노선 강남 직결을 배제한 이유로 사업비 부담, 경제성 지표 부족, 기존 노선과의 중복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동일한 잣대가 A·C노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A·C 모두 삼성역을 통과해 강남권과 직결되는 반면, B·D는 강남 연결에서 배제돼 동서 간 구조적 격차를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김포는 서부권에서 GTX 직접 통과가 확정되지 않았던 대표 지자체 중 하나였으며, 이번에도 절반의 해법만 제공받은 셈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2025년은 인구 70만 김포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로, 시민이 상상하는 김포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가 7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권 보장이 필수다. 시는 시민 체감이 가능한 대안 마련과 정책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기재부 또한 당장의 비용 논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 서부의 구조적 교통 격차와 도시 간 기능 연계성까지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김포 시민이 원했던 것은 ‘강남 30분 시대’였지만, 돌아온 건 ‘서울역 직결’이었다. 약속은 남았고, 책임은 사라졌다. 70만 도시로 도약하려는 김포에 필요한 건 성과 자랑이 아니라 실제 교통망이다.
- TAG